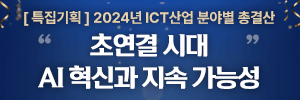[IT발자국] ‘응답하라’ 드라마 속 시티폰, 왜 사라졌을까?
- 가
- 가

- KT, 2년 7개월 만에 이용자 반토막…2000년 서비스 종료
그동안 다양한 전자제품이 우리 곁에서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을 반복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던 기기가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그 이유를 격주 금요일마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난 걸고 싶을 때 시티폰으로 건다.”
1997년 KT(당시 한국통신)의 시티폰 광고 문구입니다. 시티폰은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등장하기도 했죠. 문구처럼 시티폰은 통화를 걸 수만 있는, 발신 전용 휴대폰입니다.
◆발신 전용 기기…초기 ‘반짝’ 인기 누려=시티폰의 정식 명칭은 ‘CT-2’입니다. ‘Cordless Telephone-2’의 약자인데요.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공중전화 부스 외부에 설치된 무선 안테나 기지국을 통해 시티폰으로 발신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티폰 서비스는 1997년 3월 수도권에서 개시됐습니다. 당시 시티폰을 다루던 기업은 KT를 비롯해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이 있었죠.
시티폰은 당시 호출 전용 소형 휴대용 수신기 ‘삐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광받았는데요. 삐삐는 수신만 할 수 있는 단방향 통신기기였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공중전화 등에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삐삐로 수신을 받고 시티폰으로는 발신 전용으로 사용하는 식이었죠. 가격 또한 장점이었습니다. 시티폰은 당시 시판 중이던 셀룰러 휴대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비스 개시 두 달 만에 전체 가입자 20만명을 달성했죠. 가장 많게는 70만명까지 기록했습니다.
◆1997년 화려하게 막 올랐으나…2000년 사업 종료=시티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기지국과 100~200미터(m) 떨어진 거리 안에서만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통화를 하고 싶으면 근처에 반드시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야 합니다. 기지국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 중에 통화를 할 수도 없죠.
결정적으로 1997년 10월 개인휴대통신(PCS)이 쏟아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티폰과 달리 수신과 발신이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죠. PCS에 밀려 시티폰 이용자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1999년에는 가입자 157만명, 2001년에는 24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밋빛 예상에 무색하게 시티폰 사업은 너무 빨리 져 버렸습니다. KT는 사업 초기 시티폰 가입자가 41만7000여명에서 1999년 10월 17만9000명으로 축소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2년 7개월만에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수준이죠. 이 때문에 시티폰은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업 예측 실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시티폰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00년 1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삐삐의 경우 아직도 의료 기관 등 특수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시티폰은 서비스 종료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합법·적법”… 영풍·MBK측 문제 제기에 반박
2024-12-24 22:57:31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계획 수정…"26일까지 기다린다"
2024-12-24 18:16:54 -
'계엄'과 '탄핵'이 삼킨 겨울, 역주행 콘텐츠 살펴 보니...
2024-12-24 18:03:18 -
집회 통신장애, 2번은 없다…과기정통부, 디지털장애 총력 대응
2024-12-24 17:30:00 -
[DD퇴근길] '스티비' 해킹, 2차 피해 우려도…삼성, '갤S25' 가격 부담↑
2024-12-24 17: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