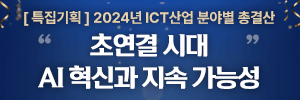통신사-장비사, 5G ‘세계 최초’ 주고받는 이유는?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노키아와 재난통신망 기술 공동개발 협력 강화’(10월5일)
‘SK텔레콤-노키아, 소물인터넷 핵심기술 확보 성공’(10월16일)
‘KT, 노키아와 함께 세계 최초 커버리지 3배 확대 소물인터넷 기술 시연’(10월27일)
‘KT, 실시간 동영상 전송 시대 앞당긴다’(10월30일)
‘LG유플러스-노키아 5세대(5G) 시험 기지국 내년 선보인다’(11월4일)
4분기 들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노키아가 발표한 협력 또는 신기술 개발 및 시연 발표 소식만 5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내지 경쟁사 보다 먼저라는 점을 앞세운다. 통신사가 기술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뭘까.
통신은 통신사와 장비업체, 단말업체가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장비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신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 손에는 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가 들려있어야 한다. 사실상 현재 통신사가 경쟁을 해도 장비와 기기는 같은 것을 쓴다는 뜻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술 개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향후 같은 장비와 기기를 써도 최적화를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라며 “단지 기술 마케팅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비업체는 곤란하다. 개발과 시연에 대한 발표를 특정 통신사에 몰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다 고객사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노키아는 초저지연 동시동영상전송서비스(eMBMS: 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협력 발표를 SK텔레콤과, 시연은 KT와 했다. 소물인터넷은 초절전 모드(PSM: Power Saving Mode) 핵심 기술을 SK텔레콤과 KT가 나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도 5G 시험 기지국을 챙겼다.
줄타기를 하며 장비업체가 얻는 이득도 있다. 상용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시험할 기회를 얻는다. 실험실에서 잘 되도 서비스 때 안 되면 소용없다. 장비업체에게 통신사와 협력은 이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최대 기회다. 4분기 들어 노키아가 통신사의 인기를 끌었지만 3분기 파트너는 에릭슨이었다. 노키아와 에릭슨은 전 세계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장비사다. 특히 국내 통신사는 4세대(4G) 진화 속도가 전 세계서 가장 빠르다. ‘세계 최초’라는 명예에도 관심이 많다. 장비업체에게 한국 통신사는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최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객인 셈이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기술 경쟁이 통신사만 이익을 보는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통신사의 기술 주도권 싸움은 5G 상용화 이후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통신사는 기술을 마케팅 도구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소비자는 헛갈린다. 기술용어를 마케팅용으로 바꿔 물타기도 자주한다.
롱텀에볼루션(LTE)도 그랬다. 올해 초에도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즉 3밴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드스(LTE-A) 주장 상용화를 발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에 비해 지원 기기를 먼저 출시했다. 하지만 이 기기가 시범 서비스용으로 드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했다. KT는 소송까지 걸었다. 이 소송은 지난 10월 KT의 취하로 마무리 됐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입장을 접었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박충권 의원실 세미나 개최
2025-01-08 11:33:58 -
베일 벗은 SKT 글로벌 AI 에이전트 '에스터'…3월 美 베타서비스
2025-01-08 11:32:31 -
"한국시장 겨냥한 전문 간병·가사서비스 인력 양성"… 케어브릿지, 베트남 하이코리안 어학원과 MOU
2025-01-08 10:49:51 -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양종희 KB금융 회장, 해외 투자자에 서한
2025-01-08 10:37:46 -
티캐스트, '2024지디웹 디자인 어워드' 골든 프라이즈 수상
2025-01-08 1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