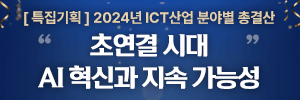ESS 화재 재발 막을 수 있을까…삼성SDI·LG화학, “신뢰 회복 총력”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김도현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배터리 업체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국내에선 20여건의 ESS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 조사는 ‘배터리 탓은 아니다’라는 결론. 하지만 배터리 업체를 향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결국 배터리 업체가 생태계 전체 신뢰 회복을 위해 총대를 멨다.
14일 삼성SDI와 LG화학은 각각 ESS 안정성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ESS는 전력을 보관하는 장치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 또는 자체 발전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한다. ▲배터리 ▲PCS(Power Conversion System)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로 구성한다. PCS는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이다. BMS는 배터리를 제어한다. 수십개에서 수천개의 배터리 셀을 하나처럼 관리한다. 운영 소프트웨어다. EMS는 ESS에 저장한 전기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가 얽혀있다.
최근 2년 동안 ESS 화재는 20여건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 6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정 사업자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배터리 제조사 총괄책임과 설계 시공 회사 책임 등 복합적 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에도 화재가 생겼다. 특히 총 26건의 사고 중 14건이 LG화학 중국 난징 공장에서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제조한 제품이어서 논란이 됐다.
삼성SDI 전영현 대표는 “ESS 화재 원인에 관계없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글로벌 리딩 업체로서 책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ESS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정밀 실험 및 분석은 물론 사이트에서 보다 가혹한 환경에서의 시험까지 포함해 올해 말을 시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만약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더라도 교체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사의 대응책은 화재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ESS 사업장은 6월 기준 1490곳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외부의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3단계 안전장치 설치 ▲배터리 운송이나 취급 과정에서 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부착 ▲ESS 설치 및 시공상태 감리 강화와 시공업체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배터리 상태(전압, 전류, 온도 등)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 운전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산 LG화학 난징 배터리를 쓴 ESS는 최대 충전량을 70%로 제한 가동하고 있다. 손실비용은 LG화학이 부담한다.
삼성SDI는 미국 안전인증기관 UL 기준을 충족한 특수 소화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고객에게도 삼성SDI가 비용을 들여 적용한다. LG화학은 화재확산 방지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파이어프루프(fireproof)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운영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원일 박사는 “ESS는 150~180회 단기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간을 살필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며 “정부가 안전성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보인다. ESS 관리에 정통한 엔지니어 등도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내리막…제작비 증가·광고수익 감소 영향
2024-12-25 12:00:00 -
[부고] 강용모(오늘경제 부사장 겸 편집국장)씨 모친상
2024-12-25 11:22:59 - 2024-12-25 11:16:06
-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합법·적법”… 영풍·MBK측 문제 제기에 반박
2024-12-24 22:57:31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계획 수정…"26일까지 기다린다"
2024-12-24 18: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