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 확산 옥죄는 공차중량 제한...왜? [소부장박대리]
- 가
- 가

(왼쪽부터) 르노, 쎄보, 마스타전기차가 국내 유통 중인 초소형전기차. [ⓒ 각사]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전세계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승용차, 중대형 상용차에 국한된 이야기다. 국내에서 가격과 유지비 부담이 적어 소형 상용차 및 경차의 대용으로 주목받는 초소형전기차의 확산은 의외로 더디다. '주행도로 제한 규정'과 더불어 이해하기 어려운 '공차중량 제한' 조항 때문이다.
초소형전기차는 법적 분류상 ▲최대 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공차중량 600kg(승용), 750kg(상용) 이하 등을 만족하는 차다. 구조상 이륜차보다 안전하고 경차보다 싼 가격에 유지비도 저렴해 도심 내 저비용 친환경 주행에 최적화돼 있다.
하지만 초소형전기차를 여전히 도심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이유는 낡은 규제 때문이다. 현재 법규상 초소형전기차는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국도 등)를 주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17년 경찰청이 국내에 유통 중인 1인승 초소형 승용 전기차 ‘르노 트위지’의 제원을 검토한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만든 것이다. 당시만 해도 초소형전기차 제작은 가성비에 집중돼 최고속도나 안전장치 수준이 일반 승용차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타당한 조치였다.
문제는 약 5년이 흐른 현재,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안전과 성능 측면에서 이전보다 대폭 개선된 초소형전기차들이 개발돼 유통되고 있음에도 규제 개선은 뒷전인 점이다.
특히 단종된 다마스와 라보를 대신하는 상용 초소형전기차들은 물가, 운영비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주행도로 제한 규정에 따라 사용처는 동네로 한정돼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이해관계자들도 전용도로 규제 완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경찰청에 적잖은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용도로 제한은 주요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인 측면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공차중량 제한 규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초소형전기차의 무게 제한은 승용 650kg, 상용 750kg이다. 경차와 비교해 보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승용전기차 A의 크기는 길이 2.8m, 높이 1.5m, 무게는 제한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내에서 널리 팔리는 가솔린 경차 B의 크기는 길이 3.6m, 높이 1.7m, 무게는 1045kg이다. 크기만 놓고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공차중량은 400kg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 같은 무게 제한이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충족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초소형전기차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다. A 모델의 경우 지방마다 다르지만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1200만원~1400만원으로 저렴하다. 1일 100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충전비용은 6만원 전후다. 반면 B 모델은 현재 유가 기준으로 월 50~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속 수십km 이상 주행하는 이동수단을 가격만 보고 탈 순 없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소비자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안전장치의 추가는 곧 중량 증가로 이어진다. 중량제한에 맞춰 다른 부품을 덜어내고 값싸고 무거운 소재를 쓰면 편의성과 주행거리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진화는 편의와 안전성이 함께 개선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현재 초소형전기차는 ‘무게의 딜레마’로 안전과 편의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정책처의 입장은 어떨까? 국내에서 초소형전기차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곳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공단 측은 초소형전기차 중량제한의 합리적 이유를 묻는 <디지털데일리> 질의에 크게 ▲유럽의 L7 카테고리 기준 참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을 설명했다.
L7은 유럽의 이륜차~경량 사륜차의 체급을 정의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 규격 중 하나다. 공차중량이 400kg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시속 45km 초과, 최대 출력 15kW를 초과하지 않는 사륜차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를 수용하되, 유럽은 배터리를 제외한 공차중량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배터리를 포함한 국내 초소형전기차는 승용 기준 600kg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매 차종이나 도로 요건 등이 다른 유럽의 기준을 왜 근거로 삼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초소형전기차가 제한적 운행 및 제작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 시 만족해야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충돌기준 등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관련 내용에 따르면 초소형전기차가 제외되는 항목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 ▲97km 이상 속도에서 타이어가 파열된 경우 기준 이상 안전도 확보 ▲안전기준에 부합한 범퍼 설치 ▲전후방 시계범위 확보 ▲시속 50km 이상에서 정면 충돌 시 기준 이상의 승객 안전도 확보 등이다. 충격 감소를 위한 소재 강성 보강, 에어백 등 일부 안전장치 강화, 디자인 변경 정도면 해결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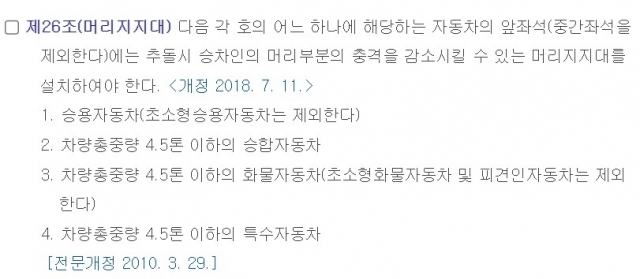
초소형전기차(초소형승용자동차)가 제외되는 자동차 안전 기준 中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소형전기차 제조사들도 이 같은 안전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 일부 제조사는 수요 측 요구로 이미 규정 이상의 안전장치를 탑재한 곳도 있다. 공단은 차량중량 제한 완화를 위해선 우선 초소형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에 적용하는 상기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차중량 제한 수준으론 모든 안전기준을 부합하는 차량의 설계가 어려워 이런 요구는 모순적이다.
이 같은 교착 상황에서 초소형전기차의 국내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낸 모 초소형전기차 제조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제조사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초소형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공차중량 제한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이면의 골칫거리”라며 “무게 제한을 최소한 지금보다 100kg만 늘려주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지지… 법원 판단만 남아
2025-01-19 15:31:10 -
공정・투명한 '공매도'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금감원 "3월말까지 전산화 완성"
2025-01-19 14:20:28 -
알뜰폰 업계, 갤럭시S25 가입자 사전유치 경쟁 ‘후끈’
2025-01-19 13:16:35 -
주담대 채무불이행자 비율도 '상호금융'업권이 가장 높아…"종합 리스크관리강화 필요"
2025-01-19 12:00:00 -
취임앞둔 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우선순위 발표 나오나… 비트코인 10만4천달러선 회복
2025-01-19 11:3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