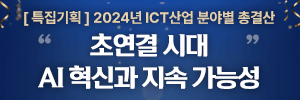협상이냐 법제화냐…복잡해진 넷플릭스 ‘망사용료’ 셈법
- 가
- 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수록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 대통령·여야, ‘글로벌 CP의 망 책임 강화’ 한 목소리
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CP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망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글로벌 CP가 국내 ISP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원칙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선 이 법안을 과방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3일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과 만난 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망사용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 18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추진에 전방위 방어
넷플릭스로서는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이 달갑지 않다. 가필드 부사장은 3일 김영식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근래 넷플릭스의 태도 변화는 이러한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의 방한 자체도 이례적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부터 연이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과방위 국회의원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부·국회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지난 4일에는 한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접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간담회 직후 “당사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면서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는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분쟁을 겪던 중 방통위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에 돌연 SK브로드밴드에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해 ‘한국 정부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이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한국 구독료를 연동할 확률이 크다.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구독료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 진출한 지 5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가격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가격 인상은 늘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
[2024 IT혁신상품] AI 협업부터 비정형데이터 보호까지…지란지교그룹 '각개약진'
2024-12-19 18:33:01 -
비트코인, 1억5000만원대 유지…RWA NOVA 코인, 비트마트에 신규 상장
2024-12-19 18:06:07 -
'계엄군 점거' 서버 살펴본 선관위 보안자문위…"침입 흔적 없다"
2024-12-19 17:56:25 -
[현장] 티빙·웨이브 합병 두고 CEO별 온도차…"주주 동의 필요 vs 無 관여"
2024-12-19 17:13:57 -
[DD퇴근길] 갈길 먼 AI 기본법…바디프랜드, '가구' 선보인 이유는
2024-12-19 16:52:18